[독후감] 박웅현의 책은 도끼다.
1. 책을 읽기 전 제목에 대한 감상
무떡대고 화가 났다. 당당하게 책은 도끼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꼬웠다. 도끼의 성질이 무엇이길래 책이 도끼라고 한 것일까?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마케팅 서적이라고 익히 알고 있었다. 그 시작점은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마케팅 관련된 책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책이 도끼다라는 그런 명제가 더 맘에 들지 않았다. 아마 나 스스로라면 그 책을 짚어 읽지 않았을 것이다. 단순한 책 표지와 당당한 그 제목은 내게 거부감만 주게 되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편견이라면 다행이다. 독서모임을 통해서 선정되어 읽게 되었고 어떻게든 그 편견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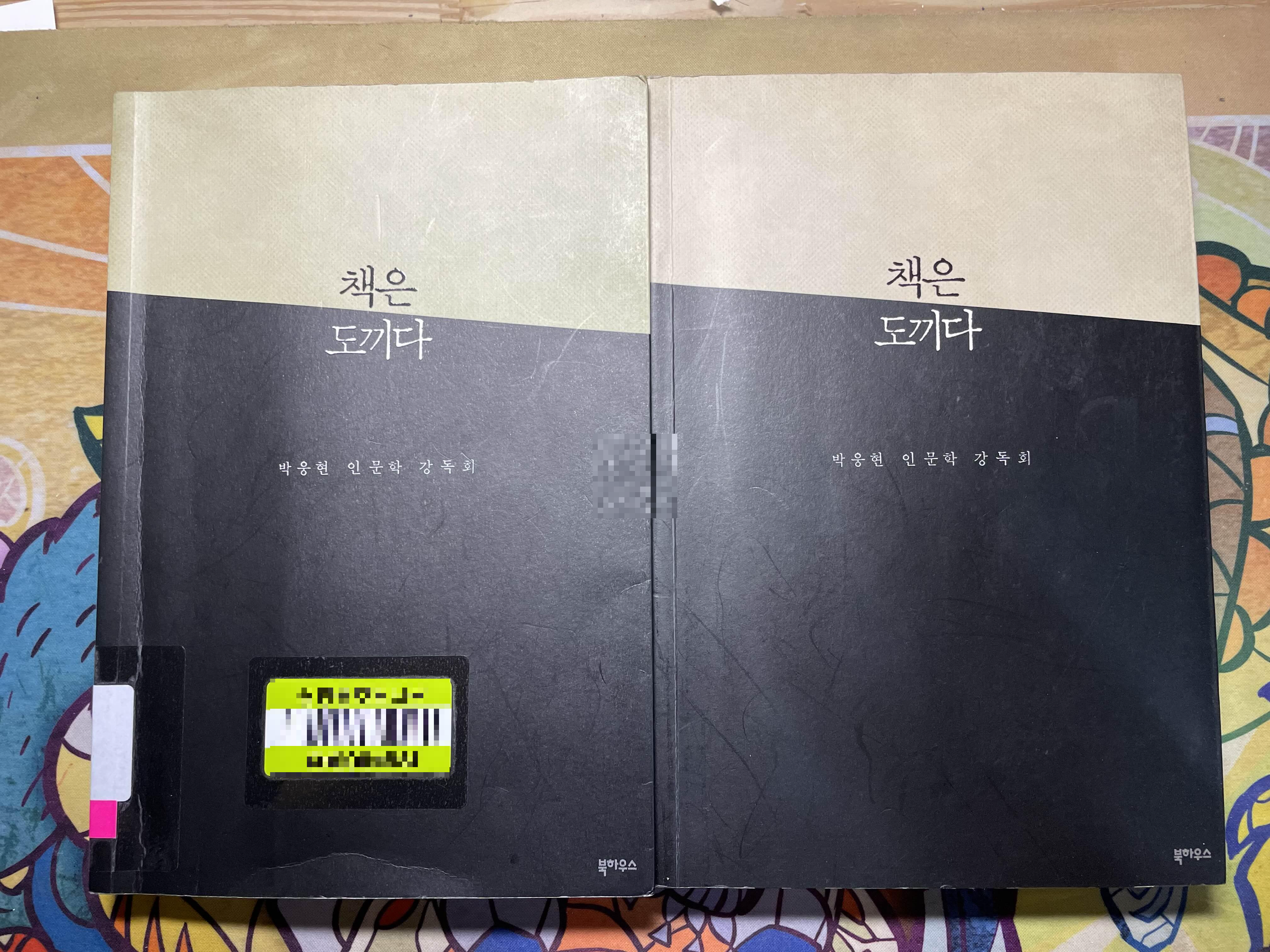

2. 독후감
부모님을 뵈러 집에 가서 쉬고 있을 때 거실 책상에 <책은 도끼다>가 올려져있는 것을 보았다. 나도 마침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빌렸는 지라 누가 내 가방에 손을 댔냐고 소리쳤다. 하지만 손을 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아빠가 사두었던 책을 다시 보려고 꺼낸 것이었다. 완전 나의 피해망상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건 아닌데 그런 듣기 싫은 소리로 이야기한 것이 부끄러웠다. 그 생각의 기저에는 이 집에서는 책 읽는 사람이 나 밖에 없다는 기만에서 오는 것도 한 몫한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가 읽는 것을 따라 읽느냐의 아빠의 이야기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둘러댔다. 아마 부끄러운 감정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될 걸 아니라고 답해버렸다. 저번 독서모임에서 양귀자의 <모순>을 읽게 되었을 때 98년에 아빠도 이 책을 읽었다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 대화로 인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아빠지만 그의 물음에 이상하게 답한 내가 후회스럽기만 하다.
<책은 도끼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다독 컴플렉스와 카르페 디엠이다. 중후반 부분에 알렝 드 보통부터 시작한 사랑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지만 최근에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어서 그런지 사랑에 대한 관심을 다 소비해 버렸다. 그렇지만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는 읽어보고 싶다. 독서모임을 햇수로 4년을 하고 있는데도 책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라는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역경 가운데에는 다독 콤플렉스와 산만한 집중력 때문이지 아닐까 싶다.
다독보다는 정독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집중력은 한정되어 있고 독서하는데 들이는 집중력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책을 읽는 속도가 더디다면 주어진 집중력 안에 많은 책을 읽기에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었다. 애초에 그러면 원론적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성찰해 보기로 했다. 심사숙고하지 않아도 쉽게 풀렸다. 그것은 다진 독서가 잘난 척에 범주안에 속해있기 때문이었다. 한 달에 몇 권을 읽고 일 년에 몇 십 권을 읽었다는 기록이 훈장으로 작용했다. 그것이 남들과는 달라 보이고 싶었던 욕구가 발현이 된 것이다. 그 욕구는 깊숙이 박혀 있었지만 쉽게 보였고 그렇지만 쉽게 내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온전히 다독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려면 이 마음부처 고쳐 먹어야 한다. 그렇다고 평소처럼 의기소침하지는 않는다. 에리히 프롬 덕분이라도 지금 이 과정이 훈련 과정이라고 여기며 용기를 얻는 중이니 말이다.
3. 인상 깊은 구절
분명 있는데 귀찮아서 생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