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만이 남는다』 독서모임 발제문 답변 (1~4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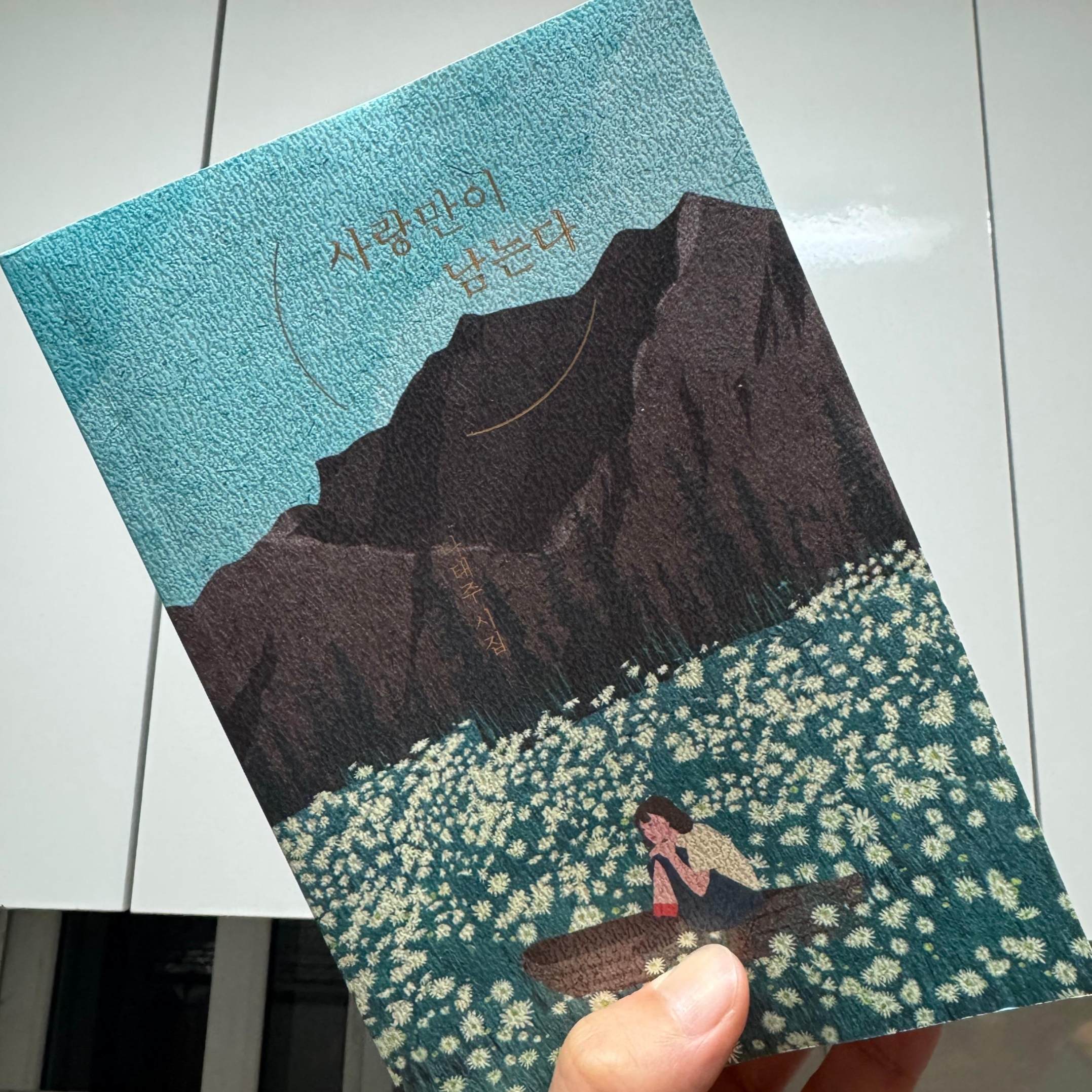
1.사랑의 여러 속성 중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그리고 『사랑만이 남는다』의 시 중 어떤 시와 가장 많이 닮아 있는지?
내가 정의하는 사랑은 ‘기다림’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과 속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내 욕심보다 그 사람의 존재를 먼저 바라보는 여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 정의는 ChatGPT와 5 Why 기법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답하면서 정리한 결과다.
그 과정에서 ‘기다림’은 단순히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방을 억누르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가능한 태도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이런 생각과 가장 닮아 있는 시는
나태주 시인의 「너에게 감사」와 「너의 총명함을 사랑한다」이다.
「너에게 감사」 – 나태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단연코 약자라는 비밀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는 일방적인 줄다리기
지고서도 오히려
기분이 나쁘지 않고
홀가분하기까지 한 게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지는 사람이
끝내는 승자라는 비밀
그걸 깨닫게 해준 너에게
감사한다.
「너의 총명함을 사랑한다」 – 나태주
너의 총명함을 사랑한다
너의 젊음을 사랑한다
너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
너의 깨끗함을 사랑한다
너의 꾸밈 없음과
꿈 많음을 사랑한다
너의 이기심도 사랑해주기로 한다
너의 경솔함도 사랑해주기로 한다
그리고 너의 유약함도 사랑해주기로 한다
너의 턱없는 허영과
오만도 사랑하기로 한다.
2. 시에서 보면 연인 / 아내 / 딸(자식)에 대한 사랑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사랑만이 남는다』 시집에서 나태주 시인은 사랑의 대상을 연인, 아내, 딸로 구분해 시를 배치했지만, 나는 그 구분을 뚜렷하게 느끼지 못했다. 시를 읽는 내내 내가 사랑하는 단짝, 여자친구를 떠올리며 읽었기 때문에 모든 시가 그 사람을 향한 시처럼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집의 사랑은 특정한 관계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사랑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느꼈다.
사랑이란 결국 관계의 이름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
애인이든, 아내든, 딸이든, 진정한 사랑이라면 결국은 기다리고, 수용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
기다림이 그러하듯, 사랑의 본질은 관계를 가로질러 통하는 어떤 감정의 결이라고 생각한다.
3. (변화 키워드) 사랑은 나 /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얼마만큼 있어야 할까?
‘사랑이 얼마만큼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지극히 철학적이다. 하지만 사랑을 숫자나 분량으로 계량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보았다. “나 또는 타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무엇이 얼마만큼 있어야 할까?”
그 ‘무엇’이 바로 아가페, 멍청하다고 할 만큼 퍼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은 동독을 계산 없이 지원했다. 그 무조건적인 헌신은 동독에게 희망을 주었고, 통일을 이뤄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통일이나 사랑 모두에서 손익을 먼저 따진다. 하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변화는 시작된다.
“사랑을 준 기억보다, 사랑을 받은 기억이 더 오래 간다.”
나 역시 이 사회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받아본다면 반드시 변화할 것이다.
에리히 프롬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훈련이라면, 나는 그 훈련의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4. (변화 키워드) 현대사회에서 사랑은 과거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과거와 현대의 사랑을 정의하고 비교해야 하지만, 나는 그런 분석보다는 단순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
나는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훈련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깊이 공감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며, 예술처럼 연습과 인내, 몰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 ‘훈련’의 개념을 점점 잊어가고 있는 것 같다. 대신 사랑은 본능과 감정 중심으로 소비되고, 에로스적 사랑이 강조된다. 요즘은 “엑셀부부”라는 말도 있다. 부부가 서로의 역할과 행동을 엑셀시트처럼 정산하며 기브 앤 테이크로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인데, 이 또한 사랑이 훈련이라는 본질을 잃고 있다는 반증처럼 보인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시 사랑을 ‘기술’이자 ‘훈련’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사랑은 훈련이고, 기다림이고,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소소한 인문학 > 독후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가, 아니면 중독된 걸까?” 『호프 자런 -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1) | 2025.05.16 |
|---|---|
| “삐그덕거리는 삶 속에서 연결과 존엄을 모색하는 사람들”『제48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2) | 2025.05.10 |
| "77학번 여대생의 시선으로 본 시대와 삶" 『은희경 - 빛의 과거』 (1) | 2025.05.08 |
| "과격한 외침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듣고 있는가" 『양귀자 -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3) | 2025.04.22 |
| "여성들의 이야기, 진희가 전해준 그 시절의 풍경" 『은희경 - 새의 선물』, (6) | 2025.04.14 |
| “정치를 멀리한 시간, 그리고 한 권의 책” 『유시민 -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2) | 2025.04.12 |
| "감수성을 되찾는다는 것, 타인의 고통 앞에 멈춘다는 것" 『예소원 - 영원에 빚을 져서』 (3) | 2025.03.31 |
| "기후위기가 삶에 스며드는 방식" 『김기창 -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3) | 2025.03.30 |